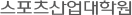| [삶과 문화] 잠 못 이루는 그대, 수컷을 위하여 / 한기봉(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 |||
|---|---|---|---|
|
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나를 아는 어떤 여성분께서 “XX하고 자빠졌네”라고 콧방귀를 뀔지도 모르겠다.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내 기억 속에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거나, 또는 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회식에 참석하고 주재하기도 했다. 노래방에도 자주 갔다. 블루스를 추기도 했다. 고주망태 인사불성이 된 적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취중에 내 입과 내 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솔직히 모를 일이다. 음심이 아니고 순수한 친근감이나 동지애의 발로였다고 치자. 그래도 성희롱의 정의는 나의 진심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나의 결백을 단언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고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다. 내 인생이, 내 앞날이 불쌍해서 그냥 눈감아 준 여성이 있을지 모른다. (있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사과하고 싶다) 나의 소싯적 직장문화는 지금보다 훨씬 남성본위적이었다. ‘용모단정’으로 여성을 채용하던 시절이다.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다. 이른바 ‘Y당’이니 ‘EDPS’로 불린 걸쭉한 음담패설을 노트에 적어놓고 다니며 술자리를 제압하는 유명인사도 여럿 있었다. 그런 남자가 수컷의 세계에선 사람 좋고 호방한 상남자로 불렸다. 음담패설은 요즘의 건배사처럼 애피타이저였다. 국내 최초의 성희롱 소송은 불과 20년 전이다.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언론이 붙인 사건 이름만 봐도 남성적 관점이다. 여성계가 지적하자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이라고 했다. 1998년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내 최초라는 말은 그 이전까진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날이 밝을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미투 장부에 오르내린다. 막을 수 없는 물결이다. 그래서 요즘 잠 못 이루는 남자가 많다. 권력깨나 쥐었거나 공인이나 공복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한밤에 가위 눌려서 슬그머니 일어나 인터넷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쳐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설사 당신이 기억을 못 한다 해도, 불행히도 그녀는 당신의 성명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녀도 지금 그대처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다른 이유로. 당신 이름을 썼다 지웠다 다시 쓰며 용기와 용서의 양 날 위에서 갈등한다. 그녀가 엔터를 누른 순간 당신 이름은 실검에 등극한다. 공소시효를 따지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당신은 이미 끝났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지겹도록 익숙한 그 클리셰를, 당신의 자발적 기억상실증을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당신의 입이 뱉은 말을, 당신의 손이 한 짓을 그들은 깨알같이 기억한다. 8년 전 장례식장에서,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에서, 집까지 바래다 준 부하 직원의 현관 앞에서, 여직원만 모아놓고 격려랍시고 한 자리에서, 취업 지원자나 인턴이나 계약직에게 보낸 문자에 당신의 지문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유감스럽게도 누군가는 녹음이나 캡처까지 해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해시태그에, 직장 게시판에, 누군가의 SNS 계정에, 수백만 회원이 왕래하는 소셜 커뮤니티에 그대의 이름 석 자가 툭 튀어나올지 모른다. 세상은 바뀌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착해져야 한다. 당신이 잠 못 이루는 남자군에 속한다면? 그녀가 차마 용기가 없거나, 잊고 용서해주길 바라거나, 아니면 당신이 먼저 커밍아웃하거나 속죄하는 길밖에 없다. 고발을 이기는 묘수는 고백뿐이다. #Ididit #mefirst #withyou.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33836dbe847c421bb12f3914dcf220c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