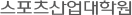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숲을 가까이 하면 삶·문화가 바뀐다/전영우 (숲과문화연구회’ 회장, 국민대 교수) | |||
|---|---|---|---|
|
2001년 6월 22일(금) - 한겨레신문 -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 지난 92년 창립된 `숲과문화연구회'를 이끄는 전영우(50)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프랑스 작가 샤또 브리앙이 했다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긴다. 그는 많은 현대인들이 숲을 가까이 하면 삶과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숲을 돈벌이 수단이나 위락 장소로만 여겨 결국 파괴하고마는 `생태 맹(盲)'으로 사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숲과문화연구회를 만든 이유는? =숲이 주는 혜택은 물질적, 환경적인 것 뿐만이 아니다. 숲은 인간의 정서와 도덕심을 좌우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부족하다. 많은 학자들이 숲을 전문적이고 현학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시민의 눈 높이에서 숲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조심스러움을 익히게 하자는 취지였다. 92년 연구회 창립 뒤 거르지 않고 낸 격월간 동호인 잡지 <숲과 문화> 회원이 1천명에 이른다. ―숲의 문화적 가치란 어떤 것인가? =독일은 200년 전부터 국가가 대대적인 산림조성에 나서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숲이 없었더라면 세계적인 독일 문학·철학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돌배나무가 없었다면 팔만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겠나. 옻나무가 없었다면 팔만대장경은 좀이 슬어 사라졌을 것이다. 조선시대 백자는 소나무로만 구웠다. 그래야 잡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 발전 곳곳에 숲이 기여한 바가 이처럼 크다. ―숲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녹색 심리학'이란 게 있다. 입원 환자들 가운데 병실 창을 통해서 숲을 볼 수 있는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를 구분해 수술 뒤 회복률을 조사했더니, 숲을 볼 수 있는 환자가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입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도 적었다는 연구결과가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다. 또 일본 환경청은 학교 폭력과 학교 주변의 녹지 밀도가 정확히 반비례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그는 “숲을 보고 느낀 감동은 그림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고 느끼는 기쁨과 다르지 않다”며 “숲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jieun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