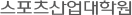| 어설프고 초라한 혁신 / 김도현(경영학부) 교수 | |||
|---|---|---|---|
|
요즘 ‘타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날 선 공방이 가장 화제였지만, 제 친구들도 ‘타다’를 두고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사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다른 산업영역에서도 이런 의견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옹호하는 시각과, 그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직장이나 기회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 주목하는 시각이 대립하는 것이지요. 이런 논의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의 변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혁신을 통해 피해나 손실을 보는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혁신이 과연 정말 의미 있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요즘 염려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다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은, 그게 무슨 혁신이냐고 힐난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정도는 되어야 하고, 세계시장을 향해 승부해야 마땅하지, 동네에서 택시를 상대로 싸워서야 되겠냐는 질책입니다. 배달서비스,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것 아니라는, 아니 더 나아가 소비자의 푼돈을 뜯는 졸렬한 서비스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들을 대단한 혁신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서비스들이 문 닫아도 그만이라는, 아니 문 닫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스타트업계가 발전해 온 공식 때문입니다. 많은 혁신기업들이 고객들의 아주 작고 소소한 문제를 푸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솔루션이 그리 큰 기술적 혁신을 포함하지 않고 있더라도, 철저한 고객 만족을 통해 고객 기반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그 고객의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구글이, 페이스북이, 에어비앤비가,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더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을 원한다면, 어설프게 보이는 수많은 시도들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밀려 쓰러지겠지만, 시도 자체가 막혀 있는 사회에서 갑자기 그럴듯한 혁신이 탄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혁신이 생각보다 매우 초라한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초라함을 비아냥거리는 대신, 가능성이라고 여기는 너그러움이야말로 혁신적인 나라로 가는 입장권입니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80939347925?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