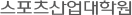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동서고금 가로지르다'展 여는 권여현씨 | |||
|---|---|---|---|
|
2004년 03월 02일 (화) 17:46
"동서양 名畵에 '나'를 던져넣었죠" '최후의 만찬' 주인공에 작가얼굴 등장 [조선일보 정재연 기자] 전시장에 들어서면 정면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펼쳐진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오른쪽에는 다시 다빈치의 ‘모나리자’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라파엘로의 ‘수태고지’, 마네의 ‘올랭피아’,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밀레의 ‘만종’, 뭉크의 ‘절규’, 김홍도의 ‘서당’, 신윤복의 ‘미인도’…. 미술사의 빛나는 걸작 40여점이 서울 안국동 사비나 미술관에 총집합했다. 그런데 주인공의 얼굴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다. 게다가 명화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반복해 나온다. 자신이 그리는 작품 속에 즐겨 등장하는 작가 권여현(국민대 교수)씨다.  지난해 한 ‘자화상’ 전시에서 이 자화상의 작가에게 ‘작가가 자신을 그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당시 권씨는 “내게 가장 절실하고 진실한 것을 그리는 것,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세상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회화뿐 아니라 작가가 직접 다양한 분장을 하고 등장하는 사진작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권씨는 작품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단면을 선보여 왔다. 1980년대 말 본격 데뷔한 그의 작업 방식이 각광받으면서 그에게는 ‘혜성과 같이 등장’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수’라는 평가도 따라다녔다.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사는가’란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작가가 그동안 작품에 다소 은근슬쩍 등장했다면 이번 ‘동서고금을 가로지르다’(3일~4월7일) 전시에서는 아예 작심하고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제자들과 함께 미술의 블록버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했습니다.” 8년 전부터 구상했고 지난 4년간 제자 총 100여명과 함께 작업했다는 이번 전시는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한 작품 선정, 등장인물 역할 분담, 포즈 결정, 사진 촬영, 사진 위 채색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유명한 그림에 직접 등장하는 작업 방식은 한때 유행했던 영화 ‘매트릭스’ 따라하기를 따라하는 식의 이벤트, 패러디 위주의 볼거리로 비칠 수 있다. 이에 대해 권씨는 “내 영역은 미술이라 명화를 택했다”며 “명화라는 통로를 통해 나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결정합니까? 천만에요. 주위 사람과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만듭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작할 때는 모두 ‘유다’ 역을 피하려 했지요. 그러나 주위에서 다들 ‘네가 유다와 제일 잘 어울린다’고 밀면 할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요.” “사회 속에서 사람이 각자 위치를 잡는 과정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는 작가는 “나는 나를 섬세하게 보지만 사회는 나를 전체적으로 볼 뿐”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내가 분홍·다홍·선홍색이 섞인 인간이라고 외치지만 외부에서는 그저 붉은색으로 보는 식으로요.” 작가가 꼽는 하이라이트는 지하에 있다. 신라의 반가사유상, 뒤샹의 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을 거울 옆에 배치한 작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너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미술사의 결정적 순간들이 만나는 꼭지점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을 거울에 비춰보도록 했다. 작가가 미술사 속을 즐겁게 유영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전시장에는 작품이 드문드문 우아하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할 정도로 빽빽하게 붙어 있다. 명화 감상용이 아니라 ‘사회 속에 던져진 나’를 생각해 보자는 전시이기 때문이다. (02)736-4371 (정재연기자 whauden@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