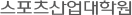| [중앙시평] 오 다이내믹 코리아 / 조중빈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중앙일보 조중빈] '다이내믹 코리아'. 현 정부가 내세운 국가홍보 컨셉트다. 생각할수록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을 더 다이내믹하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氣) 뻗치는 대한민국' 정도? [중앙일보 조중빈] '다이내믹 코리아'. 현 정부가 내세운 국가홍보 컨셉트다. 생각할수록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을 더 다이내믹하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氣) 뻗치는 대한민국' 정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을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 가진 이 역동성의 근원에 진정 무엇이 있는가 알고 싶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 올라가는 한국인의 기세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가 처음 일본에 가서 받은 느낌은 참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 한국사람을 떠올리며 들었던 생각이다. 미국인과의 조우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미국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이방인의 관찰이라 오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두 나라에서 관찰되는 정적과 긴장감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항상 시끌벅적하지 않은가. 한국사람처럼 틀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도 드물지 않은가. 거칠 것 없고,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것이 한국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를 '보우하는 존재'이고, 국가는 벌을 내리기보다 상을 내리는 '부모 같은 존재'이기에 한국인의 기가 승(勝)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신비로운 분석일까.
보다 과학적인 분석도 있다. 한국은 서양에서 말하는 '계급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조선의 반상제도가 계급사회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조선시대는 서양의 중세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그들의 봉건제도하고 조선의 반상제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비교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제에 가까울 것이다. "조선의 백성은 중세의 농노보다 자유로웠고 보다 평등한 생활을 했노라"고 말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서양의 중세사회가 해체되면서 신분사회는 계급사회로 바뀐다. 하지만 귀족이든 부르주아든 자본가이든 무엇이라고 불리든지 간에 '윗분'과 '아랫것들' 사이의 차이는 여전했고 사상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그 차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적응해 온 것이 서구의 근대사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라는 것이 서구에 비해 본래부터 별것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별것 아닌 차이조차도 서세동점(西勢東占)의 와중에서 평탄화돼 버렸다. 백성이든 국민이든 '위'와 '아래'의 차이 때문에 한이 맺힐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서가 형성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에게는 세상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게 됐다. '위와 아래 사이의 차이 없음'이 현실이자 곧 사상이 됐고, 바로 이 현실과 사상에 '다이내믹 코리아'가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열심히 뛰기만 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것이 한국인의 파토스가 되고, '빨리 빨리'가 한국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열심히, 빨리 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러한 한국적 토양에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라는 서구의 계급적 사회 갈등이 접목되면서 시작된다. 서구와 같은 유형의 계급 모순이 없는 곳에 계급이론이 접목되니 이론가들은 한국사회에 계급이 나타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계급정치나 이념정치가 근본적으로 허구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한국적 현실과 서구적 이론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386의 비극은 이를 눈치 채고 유턴해야 할 때 가속도로 직진해 버린 것이다. 그 차선을 지키기만 해도 정신을 차리련만 지금은 허구의 차선을 가로질러 왜곡의 차선으로 내달리고 있다. 우리는 어느덧 '하면 된다'의 차선에서 '너 때문에'의 차선에 서 있다. 기가 다 죽은 채 말이다. 그런데 그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걸하는 소리가 들린다. "오 다이내믹 코리아! 나 좀 도와줘. 남의 탓하기도 질렸고 나 일하고 싶어."
조중빈 국민대 교수정치학 |